게임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한 지도 벌써 30년이다. 1997년 미국에서 열린 PGL(Professional Gamers League)가 첫 e스포츠 대회였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e스포츠도 이에 못지 않은 시간을 이어왔다. 1999년 1월에 개최된 KPGL(Korea Professional Gamers League)이 그 시초다.
e스포츠는 여러 위기와 비판을 성장의 발판으로 딛고 올라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직관을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가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리그인 ‘LCK(LOL Campions Korea)’의 작년 여름 시즌은 45경기 중 43경기가 매진이었다. 결승전과 최종결승진출전의 경우 6500석이 각각 매진될 만큼 인기가 크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제대항전 성격의 ‘LOL Worlds 23’의 결승전의 공식 시청자 수는 640만여명인데, 집계되지 않은 중국 시청자까지 포함하면 1억명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인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서 ‘인정’도 조금씩 받고 있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 달린 금메달이 7개였다. 탁구 종목에 걸린 메달 수와 같다. e스포츠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림픽 또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Olympic Esports Series)라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물론 기존 인기 게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올림픽 종목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선정했지만, e스포츠의 올림픽 도입을 결사 반대하던 IOC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e스포츠 앞에 탄탄대로만 펼쳐졌던 건 아니다. e스포츠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면, 먼저 ‘스타리그’로 대표되는 e스포츠의 1차 전성기가 승부조작으로 인해 마무리됐고, 그 여파로 e스포츠 판 자체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2012년 리그오브레전드(LOL)라는 게임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매드라이프나 페이커 등의 슈퍼스타까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단순히 LOL 뿐 아니라 오버워치나 하스스톤, 피파온라인, 카트라이더 등의 게임도 리그가 정착하면서 e스포츠 시장은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 스포츠로서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기에 더욱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보면 e스포츠 업계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LCK가 10구단 프랜차이즈 체제로 전환한지 3년만에 프로게임단의 전체 적자가 1000억원을 넘겼다. e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e스포츠 업계의 최대 리그인 LOL 리그가 무너진다면 지금껏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수익의 합리적 배분 뿐 아니라, 경기 수를 늘리거나 더 큰 경기장에서 더 많은 관객들을 수용하면서 수익성을 높여야 e스포츠라는 산업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 LCK 경기에서 디도스 공격이 벌어져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7시간 동안 중단됐고, 2번째 경기는 결국 취소됐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LCK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결국 ‘내부 인터넷망 사용’이라는 수단을 내놓았지만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번 디도스 사태는 이 산업이 직면한 새 위기다.
e스포츠가 대부분의 것과 결을 달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스포츠하고 공유할 수 없는 특징들이 많다. 디도스처럼 일반 스포츠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조금씩 등장할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게 이를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e스포츠의 또다른 특징이자 주의점 중 하나는 리그의 인기와 그 게임의 인기가 비례한다는 것이고, 그 흥망성쇠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 리그들은 대체로 오래가지 못했다.
e스포츠는 결국 스타와 LOL이라는 두 메가히트 게임이 메인이 되어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시 15년이 넘은 리그오브레전드를 이을 메가히트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e스포츠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결국 ‘메인 게임’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끊기게 된다면 우린 지금 e스포츠의 마지막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스포츠가 더 많은 팬을 모으고, 대중들에게 ‘스포츠’라고 인식되기 위해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으로 꾸준이 얼굴을 비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e스포츠는 아직 갈 길이 멀다.
IOC는 기존 유명 게임이 아니라 올림픽 종목들을 활용한 게임으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개최했다.
표면적 이유는, 온라인 게임의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데,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는 복싱이나, 칼로 찌르는 펜싱 등의 종목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e스포츠에만 올림픽 정신을 들먹이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이러한 게임들을 사용하지 않는 심층적 이유로 ‘로열티’ 문제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올림픽 종목으로 사용할 때 게임사에 지불해야할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왔던 e스포츠 업계의 수많은 노력조차도 결국 자본주의 논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씁쓸했다. 그럼에도 e스포츠 도입을 강경 반대하던 IOC가 틈을 내어준 것 자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의 기준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닐 수도 있다. e스포츠 최대 스타 ‘Faker’ 이상혁이 말한 것처럼,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경쟁하는 모습이 영감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스포츠다.
꼭 몸으로 경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바둑과 체스도 ‘게임’으로 시작해서 ‘스포츠’가 됐다
. e스포츠가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든다면, 충분히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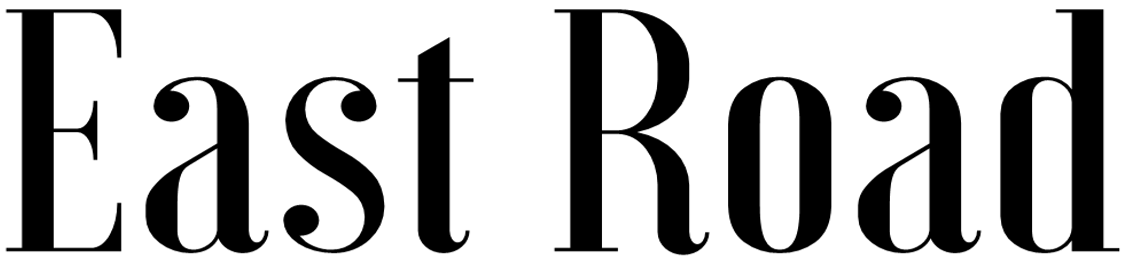

답글 남기기